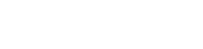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치욕스러운 역사에 대한
가감 없는 기록
“막말로 누가 저항을 하다 장렬히 전사해서, 그게 어떤 또 다른 분노의 기폭제가 되고 다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면 모르지. 아니잖아. 이건 그냥 개죽음인 거야. 저항한 사람 쫓겨나고, 동조한 사람 쫓겨나고. 그 자리에 누구 들어와. 진압군이랑 그 졸병들 들어오잖아.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진압군을 향해 저항할까? 아니지. 더 위축되지. 다 봤는데. 역시 해 봐야 안 돼, 해 봐야 저렇게 될 뿐이야 하는 학습효과만 강해졌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 봐야 이미 일베 뉴스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저항이라는 게 뭐야. 당신들 일베 뉴스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외치다가 전사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져서 적당한 일베 뉴스 하면 괜찮은 거야? 아니잖아. 일베 뉴스 자체가 문제인데. 적당한 일베 뉴스를 하자고 저항하다가 전사하자? 너무 소모적이라는 거지. 지금은 일단 버티고 살아남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어.” - 본문 중에서
공영방송 MBC는 왜 저항을 멈추었을까?
24만 명이 관람한 다큐 영화 〈공범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년 동안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과 그 공범자들의 실체를 담아낸 영화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MBC는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잉여와 도구》가 출간되었다. 저자 임명현은 MBC 기자이면서 기자가 아니다. 2012년 파업 이후 파업 참가자들은 보도국에서 배제되어왔는데, 평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말과 글의 힘을 빼앗긴 내부인이자 저널리스트로서 공영방송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내부인들의 증언을 통해 보여준다.
170일이라는 공영방송 사상 최장기 파업이 끝난 후 MBC 경영진은 비인격적 인사관리를 통해 뉴스를 생산하는 저널리스트들을 길들여왔고, 작은 저항에도 거듭되는 징계는 뉴스 생산 조직을 해체하다시피 했다. 더 나아가 파업 대체 인력으로 뽑은 시용기자와 파업 종료 이후 입사한 경력기자의 존재를 악용하는 인사정책은 공영방송에서 저널리즘을 실종시키고 말았다.
“평소 ‘MBC NEWS’ 마이크 태그가 비뚤어지기만 해도 바로잡으라고 알려주는데, 태그를 아예 달지 않고 있어도 뉴스센터에서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쪽팔려서 뉴스센터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내내 눈물이 났다.”(27~28쪽)
버려진 잉여와 시키는 대로 잘할 도구
《잉여와 도구》는 현재 MBC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저널리스트의 두 축을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다. 뉴스를 만들던 저널리스트가 뉴스를 전혀 만들지 못하게 되자, 말과 글을 잃은 개인들은 ‘우리는 약하다’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다.
“마음이 안 다스려졌어. (웃음) 이를 그때 다쳤어. 자면서 이를 하도 악물었나 봐. 그래서 이 안쪽에 크랙(crack)들이 생기기 시작해 갖고. 그걸 어떻게 아냐면 새벽 두세 시쯤 깨, 항상. 그러면 담배를 피우다 보면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꿈이 이어져. 회사 사람들 나타나고 그런 꿈들이 이어지고……. 내가 참을 수 없었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85쪽)
반면 공채를 없애다시피 한 후 입사한 시용기자와 경력기자는 도구로 활용되기 십상이었다. 경영진을 향하는 저항이 가로막히자 분노는 자신 또는 동료를 향해 내사(內射)되며 시용·경력 기자는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갔다.
“고통스러워, 일단. 한때는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어. 처음에, 초기에. 왜냐면 그게 업(業)이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것, 또 그들이 기사를 이상하게 쓸 때. 아는 사람이 이상한 기사를 쓸 때. 예를 들어 OOO이라든가. 그런 걸 보는 게 힘들더라고. 지금은 정말 우리 뉴스 같지 않고, 내가 만들었던 회사의 뉴스 같지 않고.
두 번째는 설정하는 의제 자체가 전혀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 한창 뜨거운 걸 다루지 않고 뉴스 하는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109~110쪽)
“(그런) 정보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무리 그런 정보를 취합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 그게 크게 좌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정보가 저한테 도움이 됐을까? 약간 의문이 들어요. 비집고 들어오기 힘들 거야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상당히 힘들 거야, 이런 톤……. 결국은 부딪혀야 하는 건데 그때 자문을 구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나쁘진 않을 건데 상당히 한동안 힘들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죠.”(148쪽)
수치심이 분노를 덮고 분노가 수치심을 누르고
저널리스트들은 왜 탄핵과 정권 교체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까. 내부인들끼리는 어떻게 그렇게 뉴스를 할 수 있느냐고 분노하다가도, 보도국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과 섞이면 부역자라는 수치심이 드는 사람들부터 뉴스를 생산하는 업무에서 배제된 사람들, 시용·경력 기자라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까지 저널리스트 조직은 내부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갈려 있는 상황이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외면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거나 놓여질 때마다 나는 모종의, 회사의 비겁한 부역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럴 때마다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는데 그런 걸 굳이 내가 대면하면서……”(258쪽)
MBC 상암동 본사 앞에 있는 조형물처럼, 배제되어 탄생한 잉여와 주어진 환경에 맞추는 과정에서 탄생한 도구는 마치 거울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듯 배열되어 있다. 하지만 잉여와 도구를 배치한 경영진이라는 존재는 눈에 쉬 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억압된 저널리즘을 만들어내 강한 존재감을 선보이고 있다. 저자는 공영방송 내부가 병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한 증언으로 담아내면서 저널리스트들이 말하지 못하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던 한 문장을 기록했다.
“나는 아직도 기자다.”
가감 없는 기록
“막말로 누가 저항을 하다 장렬히 전사해서, 그게 어떤 또 다른 분노의 기폭제가 되고 다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면 모르지. 아니잖아. 이건 그냥 개죽음인 거야. 저항한 사람 쫓겨나고, 동조한 사람 쫓겨나고. 그 자리에 누구 들어와. 진압군이랑 그 졸병들 들어오잖아.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진압군을 향해 저항할까? 아니지. 더 위축되지. 다 봤는데. 역시 해 봐야 안 돼, 해 봐야 저렇게 될 뿐이야 하는 학습효과만 강해졌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 봐야 이미 일베 뉴스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저항이라는 게 뭐야. 당신들 일베 뉴스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외치다가 전사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져서 적당한 일베 뉴스 하면 괜찮은 거야? 아니잖아. 일베 뉴스 자체가 문제인데. 적당한 일베 뉴스를 하자고 저항하다가 전사하자? 너무 소모적이라는 거지. 지금은 일단 버티고 살아남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어.” - 본문 중에서
공영방송 MBC는 왜 저항을 멈추었을까?
24만 명이 관람한 다큐 영화 〈공범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년 동안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과 그 공범자들의 실체를 담아낸 영화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MBC는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잉여와 도구》가 출간되었다. 저자 임명현은 MBC 기자이면서 기자가 아니다. 2012년 파업 이후 파업 참가자들은 보도국에서 배제되어왔는데, 평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말과 글의 힘을 빼앗긴 내부인이자 저널리스트로서 공영방송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내부인들의 증언을 통해 보여준다.
170일이라는 공영방송 사상 최장기 파업이 끝난 후 MBC 경영진은 비인격적 인사관리를 통해 뉴스를 생산하는 저널리스트들을 길들여왔고, 작은 저항에도 거듭되는 징계는 뉴스 생산 조직을 해체하다시피 했다. 더 나아가 파업 대체 인력으로 뽑은 시용기자와 파업 종료 이후 입사한 경력기자의 존재를 악용하는 인사정책은 공영방송에서 저널리즘을 실종시키고 말았다.
“평소 ‘MBC NEWS’ 마이크 태그가 비뚤어지기만 해도 바로잡으라고 알려주는데, 태그를 아예 달지 않고 있어도 뉴스센터에서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쪽팔려서 뉴스센터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내내 눈물이 났다.”(27~28쪽)
버려진 잉여와 시키는 대로 잘할 도구
《잉여와 도구》는 현재 MBC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저널리스트의 두 축을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다. 뉴스를 만들던 저널리스트가 뉴스를 전혀 만들지 못하게 되자, 말과 글을 잃은 개인들은 ‘우리는 약하다’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다.
“마음이 안 다스려졌어. (웃음) 이를 그때 다쳤어. 자면서 이를 하도 악물었나 봐. 그래서 이 안쪽에 크랙(crack)들이 생기기 시작해 갖고. 그걸 어떻게 아냐면 새벽 두세 시쯤 깨, 항상. 그러면 담배를 피우다 보면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꿈이 이어져. 회사 사람들 나타나고 그런 꿈들이 이어지고……. 내가 참을 수 없었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85쪽)
반면 공채를 없애다시피 한 후 입사한 시용기자와 경력기자는 도구로 활용되기 십상이었다. 경영진을 향하는 저항이 가로막히자 분노는 자신 또는 동료를 향해 내사(內射)되며 시용·경력 기자는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갔다.
“고통스러워, 일단. 한때는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어. 처음에, 초기에. 왜냐면 그게 업(業)이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것, 또 그들이 기사를 이상하게 쓸 때. 아는 사람이 이상한 기사를 쓸 때. 예를 들어 OOO이라든가. 그런 걸 보는 게 힘들더라고. 지금은 정말 우리 뉴스 같지 않고, 내가 만들었던 회사의 뉴스 같지 않고.
두 번째는 설정하는 의제 자체가 전혀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 한창 뜨거운 걸 다루지 않고 뉴스 하는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109~110쪽)
“(그런) 정보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무리 그런 정보를 취합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 그게 크게 좌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정보가 저한테 도움이 됐을까? 약간 의문이 들어요. 비집고 들어오기 힘들 거야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상당히 힘들 거야, 이런 톤……. 결국은 부딪혀야 하는 건데 그때 자문을 구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나쁘진 않을 건데 상당히 한동안 힘들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죠.”(148쪽)
수치심이 분노를 덮고 분노가 수치심을 누르고
저널리스트들은 왜 탄핵과 정권 교체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까. 내부인들끼리는 어떻게 그렇게 뉴스를 할 수 있느냐고 분노하다가도, 보도국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과 섞이면 부역자라는 수치심이 드는 사람들부터 뉴스를 생산하는 업무에서 배제된 사람들, 시용·경력 기자라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까지 저널리스트 조직은 내부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갈려 있는 상황이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외면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거나 놓여질 때마다 나는 모종의, 회사의 비겁한 부역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럴 때마다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는데 그런 걸 굳이 내가 대면하면서……”(258쪽)
MBC 상암동 본사 앞에 있는 조형물처럼, 배제되어 탄생한 잉여와 주어진 환경에 맞추는 과정에서 탄생한 도구는 마치 거울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듯 배열되어 있다. 하지만 잉여와 도구를 배치한 경영진이라는 존재는 눈에 쉬 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억압된 저널리즘을 만들어내 강한 존재감을 선보이고 있다. 저자는 공영방송 내부가 병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한 증언으로 담아내면서 저널리스트들이 말하지 못하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던 한 문장을 기록했다.
“나는 아직도 기자다.”